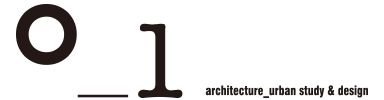언주로에 가다 혹은 언주로를 지나다/ poar 12월호 기획기사 원고 2004
언주로를 가다
원고를 쓰기 위해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가끔 지나치던 이 거리를 일요일 오후 차를 타고 지나면서, 찬찬히 다시 보려 애를 썼지만, 묘하게 이 거리는 영 시야에 잘 잡히지 않았다. 단지 눈에 잘 담기지 않았다기 보다는 부러 주어 담으려 애쓰는 데도 머리 속에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깜박하는 사이 신호대기 가까이에 서야 성수대교로 직진하는 차선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는 황급히 차선을 바꾸면서, 반포대교나 한남대교 등 다른 다리와 이어지는 강남의 가로들을 떠올려 본다. 그러고 보니 다리와 이어져 강북으로 이어져 흘러나가는 동선의 흐름이 강한 거리들은 자체가 한 단위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각기 다른 영역들의 ‘edge’가 차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성격이 강하게 된다. 새롭게 지어지는 이곳의 건물들이 강한 제스쳐로 흘러가 버리는 시선을 잡으려는 것은 그런 입지의 조건에서 비롯된 ‘필요’를 드러내는 듯 하다.
지어진지 얼마 안되어 새롭게 눈길을 끄는 알도코폴라 사옥근처에 주차를 하고 그곳으로부터 이 거리를 걸어보았다.
..COFFEE BEAN, 메리츠증권, 금수복국, SPACE*C,한창자동차 정비,삼원가든,BIRDIE,사와,와라이일식,이원석성형외과,VOLVO,이즈미,HEE COLLECTION,하늘마루,감자바우,ALDO COPPOLA..
100여 미터를 걸으며 눈에 보이는 건물들의 간판들을 적어보았다. 더도 말고 간판들의 조합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협화음이 바로 이 거리의 느낌이다. 차를 타고 지나는 속도에서 작은 스케일이 생략되어 보일 때는 특이한 건물의 입면정도를 띄엄띄엄 인지하면서 지나게 되지만, 걷는 속도에서는 이 곳은 ‘거리’라는 한 문단으로 묶어 이야기할 내용을 찾기 어려운 단문들의 연속이다. 불연속적인 그 배열은 아직은 개발의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2-3층 이내의 음식점과 차량관련시설, 저층부의 음식점과 상층부의 성형외과 혹은 뷰티숍 들이 주로 위치한 5층 정도의 근린생활시설, 최근 지어진 10층 내외의 특정한 브랜드의 사옥들로 단순화하여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문화적인, 역사적인 문맥이 없는 이곳에 작용하는 가장 강한 힘은 ‘자본의 속성’이 아닐까. 각각의 필지는 그 소유와 사용의 여러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국면에 처해 있을 것이다. 불경기에 뭔가 확실하게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요인이 없는 이곳에 투자하고 개발하고 자본을 순환시킬 힘들은 간헐적이며 불연속적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한 장소에 인접하고 있음에도 이 거리의 건물들은 모두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멋진 입면으로 지나가는 이의 눈길을 끌지만, 홀로 있는 그 건물의 의미는 물에 던져진 하나의 돌맹이처럼 잠시의 파동 외에 더 이상 증폭되지 못한다. 아직은- 낙관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일상에 각인되어 매일 매일 조금씩 새로 씌여질 텍스트가 되기 위한 어떤 ‘틀’로서의 공유하여 축척하는 시간- 기억과 역사가 생성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 벨기에 친구하나가 DTN이라는 용어로 자신의 나라를 설명할 적인 있다. DTN은 DRIVING THROUGH NATION의 약자라고 했다. 벨기에라는 나라가 가진 지정학 적인 위치뿐 아니라, 유럽 내에서 벨기에의 문화적, 상징적 위상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무언가를 담고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문화단위로서의 ‘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저 지나가는 그 기능을 충족하는데 그치는 ‘거리’가 있다. 이를 테면 언주로는 강남에 존재하는 DRIVING THROUGH STREET중 하나이다. 한편으로는 어떤 거리가 담고, 머무는 거리라면, 다른 거리는 스치고 지나는 경험자체가 의미있을 수 있도록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찰자로서가 아닌 만들어 내는 사람으로서, 언주로의 불안정한 위상이 언젠가 자신의 도시조건을 고유하게 드러내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중간단계라고- 아직은, 능동적으로 읽어내고 싶다.